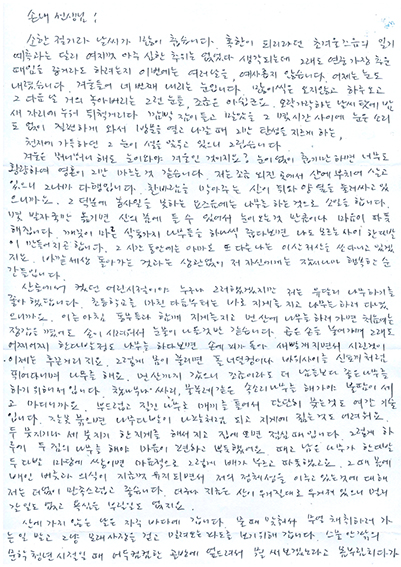
손내 선생님!
소한 절기라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혹한이 되리라던 초겨울 즈음의 일기예측과는 달리 여지껏 아주 심한 추위는 없었다 생각되는데 그래도 연중 가장 추운 때임을 증거라도 하려는지 이번에는 여러 날을,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제는 눈도 내렸습니다. 겨울들어 네 번째 내리는 눈입니다. 많이씩은 오지 않고 하루 오고 그 다음 날 거의 녹아 버리는 그런 눈들, 조금은 아쉽군요. 오락가락하는 날씨 탓에 밤새 자리에 누워 뒤척거리다 깜빡 잠이 들고 말았을 그 몇 시간 사이에 눈은 소리도 없이 질펀하게 와서 방문을 열고 나갈 때 그만 탄성을 지르게 하는, 천지에 가득하던 그 눈이 설을 앞두고 있으니 그립습니다.
겨울은 뭐니 뭐니 해도 눈이 와야 겨울인 것이지요? 눈이 없이 춥기만 하면 너무도 황량하여 영혼이 그만 마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외진 곳에서 산에 부치어 살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찬바람을 막아주는 산이 뒤와 양옆을 둘러싸고 있으니까요. 그 덕분에 농사일을 못하는 요즈음에는 나무를 하는 것으로 소일을 합니다. 몇 발자국만 옮기면 산의 품에 들 수 있어서 눈이 오는 것만큼이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깨끗이 마른 삭동가지 나무들을 하나씩 줍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한 다발이 만들어지곤 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아마도 또 다른 나는 이산 저산을 쏘다니고 있겠지요. 바깥세상 돌아가는 것과는 상관없이 저 자신에게는 잠시나마 행복한 순간들입니다.
산골에서 컸던 어린 시절이야 누구나 그러했겠지만 저는 유달리 나무하기를 좋아했답니다. 초등학교를 마친 다음부터는 바로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러 다녔으니까요. 이른 아침 동무들과 함께 지게를 지고 먼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 처음에는 장갑을 꼈어도 손이 시려워서 눈물이 나올 것만 같습니다. 곱은 손을 불어가며 그래도 어찌어찌 한 다발 정도 나무를 하다 보면 손에 피가 돌아 새빨개지면서 시린 것이 이제는 후끈거리지요. 그렇게 봄이 풀리면 돌 너덜컹이나 바위사이를 산토끼처럼 뛰어다니며 나무를 해요. 먼 산까지 갔으니 조금이라도 더 남들보다 좋은 나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참나무나 싸리, 물푸레 같은 속소리나무를 해가야 불땀이 세고 마디니까요. 부드럽고 질긴 나무로 매끼를 틀어서 단단히 묶는 것도 여간 기술입니다. 잘못 묶으면 나무 다발이 나팔처럼 되고 지게에 짊는 것도 어려워요.
두 뭇지기나 세 뭇지기 한 지게를 해서 지고 집에 오면 점심 때입니다. 그렇게 하루에 두 짐의 나무를 해야 마음이 편하고 뿌듯했어요. 때고 남은 나무가 한 다발 두 다발 마당에 쌓이면 마음적으로 그렇게 배가 부르고 따듯했고요. 그때 몸에 배인 버릇과 의식이 지금껏 유지되면서 저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 저는 더없이 만족스럽고 좋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산이 우거질 대로 우거져있으니 멀리 갈 일도 없고 욕심을 부릴 일도 없지요.
산에 가지 않은 날은 자주 바다에 갑니다. 물 때 맞춰서 무얼 채취하러 가는 일 말고 그냥 모래사장을 걷고 밀려오는 파도를 보기 위해 갑니다. 사물 안팍의 문학청년 시절일 때 어두컴컴한 골방에 엎드려서 뭘 써보겠노라고 몸부림치다가 답답한 마음을 안고 바다로 가서는 한나절씩 눈을 맞으며 덮칠 듯 달려드는 파도를 마주하고 거닐었던 시간들을 지금도 오롯하게 되풀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입니다. 바다에 가서 쓴 시 한 편 덧붙이며 이만 마칩니다. 돌아오는 설 명절, 가족끼리 혹은 이웃끼리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빕니다.
2022.1.13.
박형진 드림
한번쯤은
내가 날마다 바다에 나가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다
가령
바다, 아니 저 먼 태평양 한가운데
그 깊이 모를 검고 아득한 밑바닥에
일생에 한 번 일지도 모를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고 치자
산맥 같은 크기로 울렁이며
집어삼킬 듯 달려드는 *뉘 같은 사람
올 테면 와 봐라 무섭지 않다고
떡 하니 버티고 선 바위 같은 사람
서나로 서나로 잠잠해진
유리알 백사장을 비단이라고 치자
거기엔 차마 발자국도 못 내는
초조하게 때론 느긋하게
산산히 부서져버리고 싶은 해묵은 가슴 이 자리
돋아나올지도 모를 싹 하나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파도의 다른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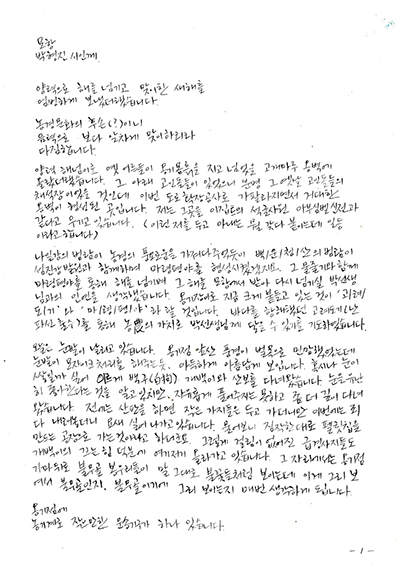
모항 박형진 시인께
양력으로 해를 넘기고 맞이한 새해를 엄벙하게 보냈더랬습니다. 농경문화의 후손(?)이니 음력으로 보다 알차게 맞이하리라 다짐합니다. 양력 해넘이로 옛 어른들이 옹기몸흙을 지고 넘었을 고개마루 옹벽에 올랐더랬습니다. 그 아래 고인돌들이 있었으니 분명 그 옛날 고인돌들의 채석장이었을 것인데 이번 도로확장공사로 가팔라지면서 거대한 옹벽이 형성된 곳입니다. 저는 그곳을 이집트의 석굴사원 아부심벨 신전 같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런 저를 두고 아내는 뭘 갖다 붙이는데 일등이라고 합니다)
나일강의 범람이 농경의 풍요로움을 가져다주었듯이 백/운/청/산의 범람이 섬진강발원과 함께하며 마령평야를 형성시켰겠지요. 그 물줄기와 함께 마령평야를 통해 해를 넘기며 그 해를 모항에서 받아 다시 넘기실 박 선생님과의 인연을 생각했습니다. 옹기장이로 지금 크게 붙들고 있는 것이 ‘고/려/도/기’와 ‘마/령/평/야’라 할 것입니다. 바다를 항해했던 고려도기(난파선 출수)를 통해 농農의 가치로 박 선생님께 닿을 수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오늘은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옹기점 앞산 풍경이 벌목으로 민망했었는데 눈발이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는 듯, 아득하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혹시나 눈이 쌓일까 싶어 이르게 백구(白狗) 개백이와 산보를 다녀왔습니다. 눈을 유난히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유롭도록 풀어주지는 못하고 좀 더 깊이 다녀왔습니다. 전에는 산판을 하면 작은 가지들은 두고 가더니만 이번에는 죄다 내려놓더니 요새 실어나가고 있습니다. 물어보니 짐작한 대로 펠릿칩을 만드는 공장으로 가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걸림이 없어진 급경사지들도 개백이의 끄는 힘 덕분에 여기저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옹기점 가마 뒤로 불무골 봉우리들이 말 그대로 불꽃들처럼 보이는데 이게 그리 보여서 불무골인지, 불무골이기에 그리 보이는지 매번 생각하게 됩니다.
옹기점에 농기계로 자그마한 운송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무너진 대포가마 천장을 흙덩이로 다시 덮으려고 구했던 것입니다. 이긴 흙을 들고 경사진 가마의 길이 27미터를 두어 번 오르락내리락 했더니 바로 다리에 힘이 빠져 과수원용으로 나온 것을 구한 거였습니다. 6.5마력의 휘발류 엔진이지만 궤도형이라 급경사도 제법 다닐 수 있어 좋았습니다. 경운기와 비슷한 작동구조에 걷는 정도의 속도라는 것도 좋았습니다. 더욱이 승차가 아니라 졸래졸래 따라다니며 작동하게 되어있어 인간적이기 까지 하답니다. 이게 덤프도 된답니다. 높이조절(리프트) 기능도 갖출 수 있었는데 그때는 가마 보수만 생각하여 넣지 않았습니다, 장작을 쌓고 내릴 때는 높이조절기능이 매우 아쉬워 생각이 짧았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놈을 데리고 이삭줍기를 다녀왔습니다. 잘해야 손목 굵기이고 손가락굵기들이라 옹기가마에는 어림없기에 굳이 할 일이 아니다 싶었더랬습니다. 그래도 너무 아까워 더러 불을 지피는 가마솥에는 요긴하다 싶어 다녀왔습니다. 금방 한 짐이 되었습니다. 팔뚝 크기로 잘라 가지런하게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장작들과의 어울림이 어색하다 싶었는데 바로 천연덕스러워졌습니다. 다가오는 설명절 진한 음식들이 다하고 나면 그 나무들이 바짝 마르지 않았더래도 돼지등뼈를 한 벌 사다가 감자탕을 한 솥 푹 끓여야겠습니다.
설,
서는 날이라지요.
세우신 뜻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2022. 1. 22
옹기장이 이현배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