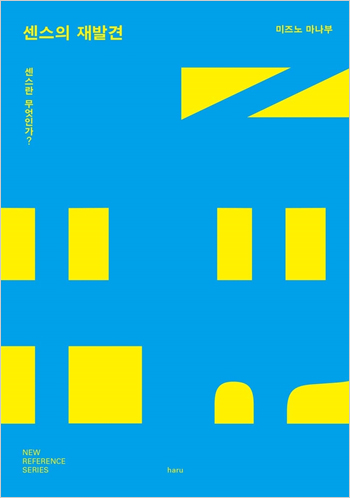
고등학생 시절 나의 꿈은 영화감독이었다. 지금도 일주일에 서너 편 씩 영화를 보지만, 그 시절의 내 기억을 떠올리면 온통 영화관의 이미지들로 가득하다. 허름한 동시상영관에서 영화 두 편을 가뿐히 섭렵하고도 로비 휴게실에서 쉼 없이 틀어주는 비디오를 배를 곯아가면서 열심히 보았다. 그 덕에 내가 얻은 별명은 '충무로'였다.
공부에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삐딱선을 타서 선생님들의 골칫거리가 되는 능력(?)도 없다보니, 그 시절의 나는 그저 평범하고 주변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존재감 미약한 아웃사이더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내가 '영화키드'로 주목을 받게 된 사건(?)이 하나 발생했다. 자율학습 중에 교실에 들어온 담임선생님이 우리들에게 대뜸 이렇게 물었던 것이다.
"엔니오 모리꼬네가 무슨 일 하는 사람이야?"
'설마 엔니오 모리꼬네를 모른다고...?' 내 의아한 눈초리를 받은 담임선생님의 표정은 진심으로 모른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반 친구들이 웅성거렸다. 답은 나오지 않았다. 요즘처럼 검색시스템이 발달한 시절이었다면 순발력 좋은 친구의 몫이 되었을 답을, 그 시절의 나는 혼자만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기... 영화음악가인데요..."
친구들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그 동안 눈 한 번 제대로 마주친 적 없던 담임선생님의 시선도 나에게 꽂혔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잠깐의 정적 후에 반 전체에 흘러나오는 '와~'하는 함성. 그 날 이후 나는 요즘 말로 하자면 '영화 덕후' 취급을 받으며 친구들로부터 관심대상이 되었다. 충무로라는 별명도 그 때 얻었다.
그 후로 사 반 세기의 시간이 흘렀다. 나는 지금 영화감독이 아닌 방송국 프로듀서로 살아가고 있다. 아직 영화라는 원대한 꿈을 펼치지는 못했지만, 무언가를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해서 온전히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직업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절반의 성공'은 거둔 셈이다.
어쨌거나 뚜렷한 목적의식보다는 이런저런 삶의 계기들이 작동하여 내가 방송국 PD라는 직함을 얻은 지도 벌써 십 수 년이다. 매번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스태프를 꾸리고 또 그들과 함께 촬영하고 후반작업해서 방송으로 내보내는 일이 쉽지는 않다. 마치 처음 겪는 일인 것처럼 한계상황이 반복된다. 이제 적응할 만도 한데 그렇지 못하다. 이럴 때마다 자문하게 된다.
'난 센스가 부족한가...?'
2017년을 맞이해 새로운 정규 프로그램 런칭이 나의 몫으로 할당되었다. 두 달 전부터 고군분투했다. 어떻게 하면 신선한 포맷으로 신선한 재미와 감동을 전달할 것인가. 이 '신선함'이라는 화두에 휘둘리면서 몸과 마음이 망가져갔다. 그러면서 또 다시 치고 올라오는 생각. '나는 센스가 정말 부족한가?'.
벼랑 끝으로 몰렸다는 생각에 압도되었을 무렵, 서점에서 내 손에 들어온 책이 하나 있었다. 일본의 디자인 디렉터 미즈노 마나부가 쓴 <센스의 재발견>. 이 한 권의 책이 나에게는 든든한 구원군이 되어주었다.
'지식이라는 것은 종이이고, 센스는 그림이다.
종이가 크면 클수록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자유롭고 대범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 <센스의 재발견>, 73쪽 -
이 책이 흥미로웠던 것은,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센스에 관한 관념을 상당부분 해체시켜주었다는 것에 있다. 센스는 하늘이 내린 선물 같은 것이라고, 타고나지 않으면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취급해왔는데,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가능성을 넓힐 수 있다'(70쪽)는 센스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 놀랄 수밖에.
창조적이지 않은 일이 어디 있을까마는 여하튼 상대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창조성이 요구되는 직업일수록 센스에 대한 강박도 크다. 그렇다면 센스란 무엇인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센스에 대한 정의는 '톡톡 튀는 감각' 정도 아닐까? 당연하게도 이 센스 앞에서 '평범함'은 무덤 그 자체다. "이건 너무 평범하잖아!"라는 말은 곧 센스의 사망선고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센스를 위해서 우리는 평범함을 거부해야 한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은 이전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센스에 대한 상식이다. 하지만 <센스의 재발견>을 집필한 미즈노 마나부는 이렇게 말한다.
"평범함이야말로 '센스가 좋다/나쁘다'를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다."(16쪽)
이 무슨 황당한 궤변인가. 평범함이 톡톡 튀어야 할 센스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센스의 중요한 척도라니. 말도 안 되는 이 센스의 정의에 그가 제시한 논거는 이렇다.
"평범함이란 '좋은 것'을 아는 것 / 평범함이란 '나쁜 것'도 아는 것
양쪽을 모두 알아야 '가장 한 가운데'를 알 수 있다.
센스가 좋아지고 싶다면 우선 평범함을 알아야 한다.(16쪽)"
미즈노 마나부는 '타고나는 능력'으로서의 센스의 정의를 거부한다. 그게 센스 있고 없음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건 아주 미약한 연료일 뿐이다. 대신 그가 '센스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이렇다. "센스란 지식의 축적이다".
정말 그런가? 센스는 감성의 영역이고 지식은 이성의 영역이라는 이분법이 우리의 일반 상식이다. 그래서 센스와 지식을 물과 기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나도 이 이분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미즈노 마나부는 이 흑백논리를 거부한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지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정의는 냉철한 이성 위에 얹혀진 빈틈없는 논리의 향연이다. 그래서 지식의 축적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건 엄연한 사실이다. 반면 센스는 톡톡 튀는 그 무엇이며, 굳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기 보다는 센스 있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요행을 바라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게 이미 말했듯 우리들이 가져온 상식이다.
그렇다면 <센스의 재발견>을 쓴 미즈노 마나부는 상식으로 통용되는 지식/센스의 이분법을 뭉개면서 독자들에게 무엇을 진정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일까. 내가 이 책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 해답은 사람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아닐까 싶다. 센스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을 잘 들여다볼 수 있을 때 발휘된다는 것이다. 그 판단의 근거가 바로 평범함이다. 하지만 평범함을 제대로 포착할 수 있는 시선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 결실이 바로 지식이다. 그러므로 지식은 센스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이다.
2016년과 2017년을 관통하는 겨울을 보내며, 우리는 센스 없는 대통령을 뽑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 수 있는 지를 체험하고 있다. 평범함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불통 대통령의 센스 없는 정치. 그 분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촛불을 밝혀야 했던 그 평범한 판단을 이해하지 못한다. 정말 센스 없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권력을 향해 돌진하는 그들에게 미즈노 마나부의 이 말을 다시 꺼내들고 싶다.
"센스가 좋아지고 싶다면 우선 평범함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