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음악들
이휘현 KBS 전주 P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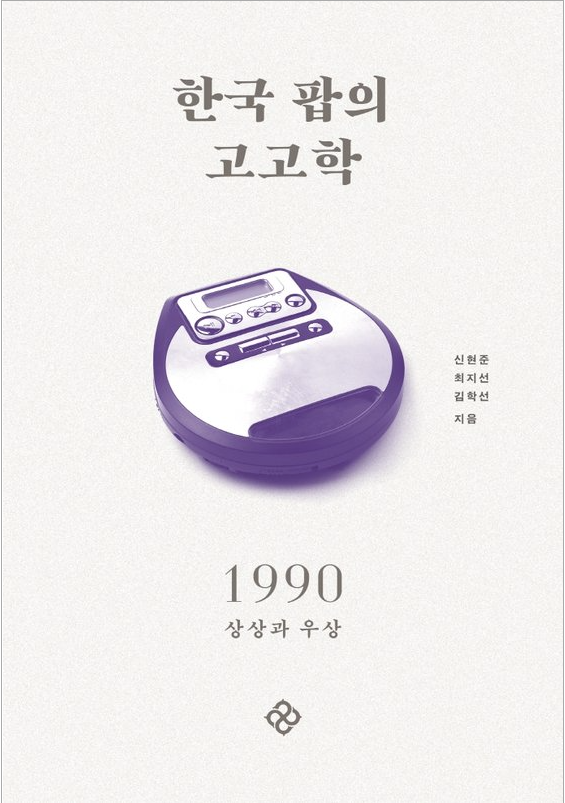
김창환 프로듀서를 처음 만난 건 지난해 5월의 일이다. 1년 넘게 제작해오던 음악 방송 프로그램 때문에 갖게 된 첫 미팅이었다. 그간 왕년의 유명 가수들을 여럿 만나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김창환 프로듀서와의 만남은 그 어떤 뮤지션들 보다도 더 긴장감을 유발했다.
그로 말할 것 같으면 내 20대 시절의 국민가수 신승훈과 김건모를 키워 위세를 떨친 명 프로듀서 아닌가. 그뿐만이 아니다. 박미경과 클론도 발굴해 낸 1990년대 한국 엔터테인먼트계의 거물이기도 하다. 그런 사람이 나를 보잔다고? 웬열!
1995년 봄의 기억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나는 강원도 철원 최전방부대에서 군복무 중이었는데, 그 첩첩산중까지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열풍은 대단했다. 고된 훈련 중 고참 한 명이 장병들 앞으로 나와 “노래 일발 장전!” 이후 그 노래를 신나게 불러제꼈다. 그때 나는 세상에 저렇게 멋진 노래가 있나 싶었다.
육군 상병이라는 대한민국 최하층 신분의 남자가 그로부터 27년 후 당시 대한민국 문화 권력 최상위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던 사람과 독대를 하게 되다니! 군부대에서 함께 <잘못된 만남> 생목 라이브를 듣던 선임 후임병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내가 그 노래를 만들고 제작한 사람과 얼굴을 맞대게 되었단 말이다!!
서울 방배동 그의 빌딩 사무실로 들어가는 나는 잔뜩 긴장했다. 주머니에는 1992년 겨울 구입해 고이 간직하고 있던 노이즈(NOISE) 1집 테이프가 들어 있었다. 그룹 노이즈도 김창환 프로듀서의 작품이다. 30년 전 그 음반을 늘어지게 들었는데, 왠지 그날 쓸모가 있을 것 같았다. 내 판단은 적중했다.
“나도 못 가지고 있는 테이프를 피디님이 가지고 있어?”
그의 표정이 금세 밝아졌다. 이때를 놓칠세라 나는 나의 20대를 꽉 채운 1990년대 한국 대중음악의 기억을 주저리주저리 읊어댔다. 이럴 때마다 나는 썩 나쁘지 않은 말솜씨를 갖게 해 준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피디들이 말이야, 음악을 잘 몰라. 심지어 음악 프로그램 만든다는 놈들도 그렇더라고. 다들 대가리들만 굵어져서 쯧쯧.”
나는 슬슬 눈치가 보였다. 아, 불합격인가? 내가 너무 나댔나? 입이 바짝바짝 말라 갔다.
“근데 말이야, 이 피디는 음악을 좀 아는구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음악을 사랑한다는 게 느껴져. 그 노이즈 테이프 이리 줘봐. 표지 안쪽에다 사인해주면 될까?”
오호 쾌재라! 다음을 기약하며 빌딩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가벼웠다. 두 번째 미팅 땐 좀 더 단단히 무장해 가리라. 1990년대 한국 대중음악은 이제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수많은 기자나 평론가들이 1990년대를 한국 가요의 황금기라고 이야기한다. 엄밀히 말하면 ‘음반’ 산업의 활황기를 뜻하는 것일 게다. 그 시절 ‘밀리언 셀러’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왔는데, 배고픈 딴따라라 멸시받던 가수들이 땅 사고 빌딩 살 만큼 큰돈을 벌기 시작한 것도 1990년대 이후의 일이다. 그리고 그건 ‘X세대’라 명명되던 새로운 청년문화의 등장과 궤를 같이한다.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진 첫 세대. ‘개인’의 의미를 머리가 아니라 감성으로 받아들인 세대.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갖지 못한 ‘풍요로운 20대’를 만끽한 신세대들이 바로 1990년대 한국 가요 황금기의 주역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음반을 사기 위해 기꺼이 주머니를 열어 주도적인 팬덤을 형성해 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태지’라는 시대의 아이콘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X세대의 열광에 호응하듯 사회적 메시지를 노래에 담기 시작했다. 열광은 ‘담론’으로 이어졌다. 팝 칼럼니스트들이 서태지를 주목한 것이다. 한국 가요계에 진지한 평론이 넘쳐났다. 단행본들도 속속 출간되었다. 그 시절 나온 책이 <서태지를 읽으면 문화가 보인다?!> <서태지와 꽃다지> 등이다. 나는 이 책들을 지금도 서재에 고이 간직하고 있다.
<한국 팝의 고고학–1990 상상과 우상>은 그 화려했던 시절을 매우 깊고 또 넓게 파고든 귀한 책이다. 서태지 이전 윤상과 신해철, 김현철 등으로 시작해 세기말 HOT, 젝스키스 그리고 god로 막을 내리는 거대한 가요 서사시라고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워낙 방대한 분량이라 책 두께에 지레 겁을 먹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단 책표지 안쪽을 들추면 금세 내용에 빨려 들어갈 공산이 크다. 적어도 그 시절 청춘을 이 책 속 음악들과 함께 보냈던 이들이라면 말이다.
페이지 사이에서 신해철은 독백하듯 <나에게 쓰는 편지>를 읊조리고 서태지와 아이들은 <난 알아요>로 멋진 랩을 내뱉는다. 공일오비가 <아주 오래된 연인들>로 신세대의 사랑을 설파하고 듀스가 뉴 잭 스윙이라는 멋진 댄스 장르로 무장해 우리를 홀린다. <안녕하세요>라며 안부를 전하던 삐삐밴드는 그야말로 문화충격이었다. 황신혜밴드의 <짬뽕>은 말해 무엇할까!
기억의 회로 속에서 음반이 재생되듯 책을 넘기며 그 시절 수많은 명곡들을 듣게 되는 신기한 체험. 다양한 장르 다양한 음악 다양한 가수들이 넘쳐나던 시대를 살아왔구나, 라는 새삼스런 자각. 저 심장 밑바닥에서 밀고 올라오는 묘한 감동과 전율.
세기말 새롭게 대두한 음원 시장과 아이돌 산업이 음반 팔리던 시절의 최강자 1990년대 슈퍼스타들을 역사의 뒤안길로 흘려보냈지만, 어쩌면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오늘날의 K팝은 이 1990년대라는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게 아닐까. <한국 팝의 고고학-1990 상상과 우상>은 이에 관한 단단한 논증일 것이다.
어느덧 30년, 세월은 흘렀고 청춘은 떠났다. 그래도 음악은 남았다.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노래들. 그 아련한 사운드 뒤에 숨어있던 땀과 눈물 그리고 열정의 이야기들. 추억이 음악의 힘을 빌려 쓸려간 청춘을 소환한다. 그리하여 그 눈부시게 찬란했던 시절을 보낸 X세대들에게 <한국 팝의 고고학-1990 상상과 우상>은 큰 위로를 안겨준다. 잃어버린 청춘을 보상받는다는 느낌?
아참, <한국 팝의 고고학>은 총 네 권의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다. 1960, 1970, 1980, 1990, 이렇게 10년 주기로 나뉘어 있는데, 각자 청춘의 시간에 맞춰 책을 골라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