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로 칼비노의 환상소설 ‘우리의 선조들’ 3부작
이휘현 KBS 전주 P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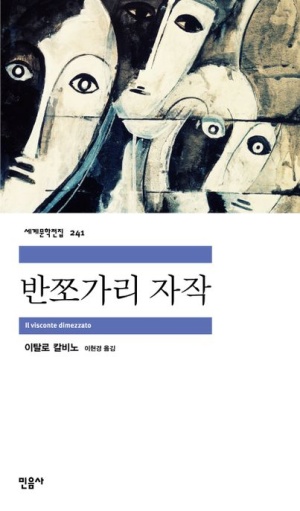
신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귀족으로서의 고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십자군전쟁에 참전한 메다르도 자작. 하지만 제대로 전투를 치러보기도 전, 상대편 투르크 군대의 포화에 그의 몸 절반이 날아가 버리고 만다. 팔도 하나, 다리도 하나, 눈과 귀도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메다르도 자작의 육신. 그것뿐인가. 코도 절반, 입도 절반. 몸뚱어리도 절반 그리고 거기도… 음…….
여하튼 반쪼가리로 남은 육체를 가지고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 귀향한 그는 자신의 영지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한다. “선하기 그지없던 예전의 메다르도 자작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백성의 탄식은 끊일 날이 없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나머지 반쪽이 영지에 입성한다. 세상에 이런 일이? 대포에 갈가리 찢겨 날아간 메다르도 자작의 육신 절반을 십자군의 용한 의사들이 되살려낸 것이다. 이 새로운 반쪼가리 자작은 기존의 반쪽이 저지른 악행들을 수습하려 애쓴다. “제 반쪽의 나쁜 짓을 부디 용서해주소서.”
한편 악의 화신인 원래 반쪽은 새로운 반쪽의 선행을 좌시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를 없애기 위해 온갖 술수를 동원하는데…. 반쪽과 나머지 반쪽의 처절한 혈투.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아니! 이런 소설 같은 얘기를 누가 그렇게 능청맞게 씨부리나!!’라고 역정 내실 분들 계실 것 같다. 좋은 지적이시다. 이 이야기는 소설이 맞으니까. 제아무리 발달한 현대의학이라 해도 사람이 반으로 나뉘어 서로 아귀다툼 벌이며 살 수는 없다. 하물며 중세는 말해 무엇할까.
이 기이한 이야기는 이탈로 칼비노의 소설 <반쪼가리 자작>을 간단히 정리해 본 것이다. 이 작품을 시작으로 그는 ‘우리의 선조들’ 3부작을 연이어 발표해 전 세계 독자들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문학적 위상과 걸맞지 않게 작가와 작품의 인지도가 현저히 낮다. 이 지면에 그와 그의 작품을 할애하는 이유일 것이다.
우선 작가부터 알고 넘어가자.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이탈로 칼비노(Italo Calvino 1923-1985)는 쿠바 태생의 이탈리아 소설가다. 스물넷의 나이에 스페인내전을 배경으로 장편소설 <거미집으로 가는 오솔길>을 써 문단의 주목을 받은 그는, 1985년 예순두 살의 나이에 뇌일혈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꾸준히 작품을 발표했다. 그의 때 이른 죽음이 아니었다면 노벨문학상의 영예가 그의 품에 안겼을 것이란 세간의 추측이 단순한 억측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그의 이름은 고국 이탈리아를 넘어 20세기 세계문학의 꼭대기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탈로 칼비노의 문학을 관통하는 것은 일련의 ‘환상성’이다. 도저히 세상에 있을 법하지 않은 이야기로 활시위를 당기는 그의 서사. 하지만 그렇게 날아간 활이 정확하게 도달하는 과녁은 놀랍게도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니까 이탈로 칼비노는 환상 문학이라는 알레고리를 도구 삼아 철저하게 당대의 삶을 해부한 것이다.
물론 그의 문학이 처음부터 그런 환상성을 띄었던 것은 아니다. 처녀작 <거미집으로 가는 오솔길>(1947)은 리얼리즘에 기반한 소설이었다. 다만 이 작품에서도 우화의 성격이 살짝 엿보이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의 예술적 기질 자체가 태생적으로 비현실적 모티프들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환상 문학 대가로서의 면모는 그의 두 번째 작품 <반쪼가리 자작>(1952)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이 소설이 평단의 큰 환호를 받자 이탈로 칼비노는 <나무 위의 남작>(1957)과 <존재하지 않는 기사>(1959)로 이어지는 ‘우리의 선조들’ 3부작을 발표했다. 세 작품 모두 중세를 배경으로 ‘평범하지 않은 어느 귀족’의 이야기를 펼치는 공통점이 있다.
열두 살 때 저택 앞 숲으로 가출한 후 죽을 때까지 평생 나무 아래로 내려오지 않은 코지모 남작. 그리고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존재하는 아질울포 기사의 이야기는 선한 반쪽과 악한 반쪽이 숙명의 대결을 벌이는 메다르도 자작의 이야기만큼이나 기괴하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들이, 그런데 묘하게도 독자들을 빨아들인다. 이성적으로는 몰라도 적어도 감성적으로는 제법 설득력이 있다. 그 이유는 무얼까.
우리의 선조들이라 명명되는 이 세 명의 귀족 각각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주기 때문일 것이다. 누구의 마음속이든 선악은 공존한다. 하나의 욕망을 두고 선과 악이 충돌한다. 두 반쪼가리의 대결은 결국 우리 속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내면 갈등을 표상하는 셈이다. 세상 밖으로 눈을 돌려보자면 <반쪼가리 자작>이 발표된 1952년은 동서 냉전의 좌우 대립과 핵무기에 대한 인류의 공포가 최고조에 달한 시기이기도 했다.
한편 이 지독한 현실에서 발을 빼 나만의 성채를 세우고 싶은 마음. ‘관계’라는 복잡한 망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현대인의 강렬한 욕구는 나무 위에서 자신만의 망명정부를 세운 코지모 남작의 고독과 고립에 가 닿는다.
존재하지 않음이 곧 존재 이유인 중세 기사 아질울포의 모순은 우리가 일상에서 끊임없이 맞닥뜨리는 존재 부정의 순간을 상기시킨다. 우리는 살다가 언제든 ‘존재하지 않는 기사’의 모순된 실존적 운명과 조우하게 된다. 그것도 종종.
이탈로 칼비노의 문학적 성취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통해 우리가 끊임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인간의 나약한 운명을 환상이라는 알레고리를 통해 풀어낸 데에 있다. 그들의 행로는 몹시도 쓸쓸했으나, 아 어찌할 것인가, 그것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을…. 특히 ‘우리의 선조들’ 3부작이 이탈로 칼비노 문학의 백미라 불리는 이유도 이 때문 아닐까 싶다.
이후 그의 환상문학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도시들을 횡단하다가 끝내 우주로 날아간다(<마르코발도 혹은 도시의 사계절> <보이지 않는 도시들> <모든 우주만화> <팔로마르> 등등). 그 문학적 진경을 목격하고 싶다면 당장 서점으로 달려가면 된다. 한국은 이탈로 칼비노의 모든 작품이 번역되어 전집으로 출간된 썩 괜찮은 나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