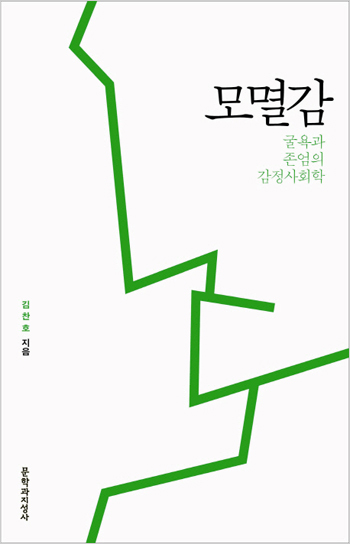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 가장 끔찍한 단어 하나를 선택해 보라고 누군가 나에게 종용한다면, 나는 주저 않고 '관계'라는 것을 꺼내놓겠다. 그것은 달콤한 매혹으로 나를 홀리다가도, 어느 순간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영혼의 심장을 파고든다. 황홀할 날갯짓으로 천상의 안락의자에 앉혔다가, 또 순식간에 벼랑 끝 지옥의 불구덩이로 추락하게 만든다. 그것이 바로 '관계'라는 요물이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상, 우리에게 이 '관계'는 천형(天刑)처럼 따라붙는다. 그래서 누군가들은 이 굴레를 벗어버리기 위해 '운둔'이라는 망명처나 '단절'이라는 극약처방을 불사한다. 허나 이를 어찌할까! 은둔이나 단절마저도 완벽한 진공의 상태에 놓이지 않는 이상 이 '관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관계라는 것에 어떻게 대응하고 또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
사회학자 김찬호가 쓴 <모멸감>은 이 물음에 대한 인문학적 보고서이자 현실적인 처방전이다. 그리고 그의 돋보기는 유독 '상처주기'와 '상처받기'가 일상처럼 되어버린 이 곳, 한국사회를 들여다보고 있다. '각개약진 공화국'이라는 강준만 교수의 표현처럼, 대한민국의 지난 세기는 꽤나 다이내믹했다. 오백년 역사의 왕조가 사라지고 수십 년 지속된 식민의 역사, 해방과 전쟁, 독재와 민주화, 급속한 경제 성장이 쓰나미처럼 쓸고 간 자리엔 항상 각개약진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 기회들은 곧 과도한 경쟁을 부추겼다. "승리하지 못하면 비참해진다"라는 승자 독식주의가 한국사회에 만연하면서 입시지옥, 아파트 투기 열풍,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 등이 뒤따랐다. 그 결과물로 수많은 한국사람들에게 자리 잡은 게 바로 '낮은 자존감'이라고 김찬호는 말한다.
웬만큼 잘나지 않으면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중략)… 거기에서 비롯되는 결핍과 공허를 채우려고 갖은 애를 쓰는데, 한국인들이 많은 취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타인에 대한 모멸이다. 누군가를 모욕하고 경멸하면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이다.
- 김찬호, <모멸감>, 6쪽-
김찬호는 이 '모멸감'이라는 극단적인 감정이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분석틀로 제공한다. 요 몇 년 사이 우리나라에서 회자되는 '갑·을 관계'가 그 대표적인 예다.
신이 아닌 이상 우리가 완벽한 도덕관념과 당위성으로 무장해 이 상처의 관계를 극복해 나갈 수는 없다. 대신, 줄여갈 수는 있다. 할 수만 있다면 덜 상처주고 덜 상처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 기본바탕에는 저 바닥까지 추락했다고 느껴지는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하지만 자존감 회복은 나만의 의지로는 부족하다. 상처받은 자존감을 위무해줄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다. 김찬호의 <모멸감>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상처의 관계가 아닌 상생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썩 괜찮은 매뉴얼이다. 일독을 권한다.



